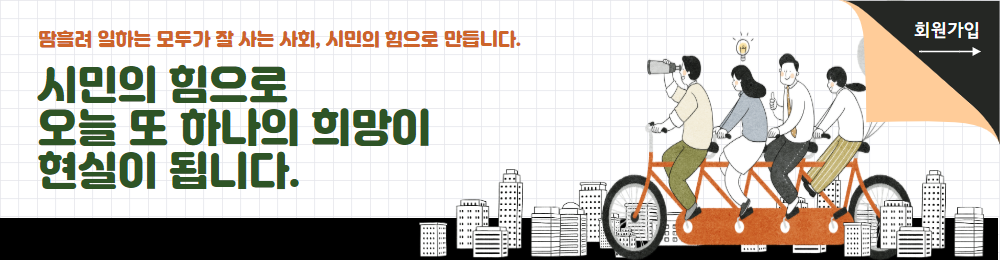[특집] 정책금융의 부저추신, 부동산금융의 봉위수기, 디지털금융의 견리사의를 실천해야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6)금융]
정책금융의 부저추신,
부동산금융의 봉위수기,
디지털금융의 견리사의를 실천해야
- 배수거신, 대마불사, 조삼모사 식의 금융지원정책은 이제 그만 -
정호철 경제정책팀 간사
윤석열 정부의 2022-2024년 금융정책
윤 정부의 금융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가 미는 거품경제”로 정의할 수 있다(정호철, 2022). 물론, 개중에는 코로나19 시기에 대출 채무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저신용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채무조정 등의 정책금융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정책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금융정책들까지 종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민생경제에 대한 이해, 자산격차에 대한 이해, 시장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라고 내걸기에는 많이 부끄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었다. 윤 정부의 지난 2022~2024년 금융정책 방향은 (1)정책금융, (2)부동산금융, (3)디지털금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중·소상공인 대상 1%대 저리·장기대출, 채무조정, 보증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폐업을 막지 못했고, (2)부동산경기와 PF(Project Financing)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DSR),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역시 역전세난으로 인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또한 (3)“혁신”을 핑계로 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확대(은산·금산분리 완화)와 “공정”만 앞세운 자본시장·가상자산 정책은 그저 포퓰리즘에 그쳤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제22대 국회가 금융 분야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은 무엇일까?
➊ 정책금융 : 배수거신(杯水車薪) → 부저추신(釜底抽薪)
코로나19 위기 이후 정책금융은 배거수신과 같았다. 즉, “한 잔의 물을 한 수레의 장작불에 끼얹는다”는 뜻으로 아무 소용 없었음을 말한다. 윤 정부는 ① 초저금리 금융지원 정책으로서 코로나19로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1~2천만원 →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한도 내 금리 1%를 지원하는 한편, △’20.3~’22.6 폐업한 75만개 중·소사업장 중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5천만원까지 대출한도 내 금리 2%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② 긴급구제식 채무조정(△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및 맞춤형 지원으로서 기존에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대출을 받았던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채권 매입과 채무조정을 약속했다. 금리가 치솟는 요즘 같은 시기에 소상공인이나 저신용자들의 채무 부담과 고통을 일시적으로나마 덜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도표1>. 하지만 기존의 채무 부담을 해소하는 데 큰 소득은 없었다 <도표2>.

이는 기존의 고리대출에 대한 적극적인 금리경감 등을 통해 장기적인 채무부담을 덜어주기보다는, 단편적인 부실채권을 틀어막기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나 거치식·장기·분할상환 등 소극적인 상환지원책에 급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경제위기가 계속 장기화될 경우, 이처럼 소극적인 상환지원책보다는, 민간부채 출구전략으로서 적극적인 금리경감을 통해 민생경제가 스스로 채무를 해소하고 자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이는 정책금융이야말로 현재 시기에 긴요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환대출(*신규 저리대출을 받아 기존의 고리대출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을 통해 민생경제가 시장에서 스스로 채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금융이야말로 바람직한 정책이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가자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 불안한 시기에는 달러 스와프[swap]를 통해 중•소무역업체에게 외환지원과 환율안정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수출경제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안정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서민금융을 통한 정부의 전액 채무변제나 손쉬운 파산·회생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채무면탈 등의 도덕적 해이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생경제의 자생을 위해서 이제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정책금융에서 추진해야 할 방향은 부저추신이다. 즉, “타는 장작을 빼내 솥이 끓어오르는 것을 막는 것”처럼 민생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다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야할 것이다.
➋ 부동산금융 : 대마불사(大馬不死) → 봉위수기(逢危須棄)
우리나라의 부동산금융은 대마불사와 같다. 대마불사는 바둑에서 “대마는 쉽게 죽지 않음”을 일컫는 말로, 경제학에서 거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그와 이해관계가 얽힌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피해를 봐서 경제 전체적으로 재앙적인 사태가 벌어지므로 정부가 그러지 않도록 반드시 구제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구본천, 1998). 윤 정부는 ③ 부동산경기의 안정화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무주택자, 다주택자, 매매·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LTV를 <도표3>과 같이 완화해주는 한편, ④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의 경우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대출한도를 늘려줬다1).

그 결과, 가계대출의 유동성과 아파트매매가격의 증가속도가 다시 상승하면서 <도표4>, 부동산시장은 6개월만에 다시 회복세를 되찾았다 <도표 5>.

하지만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아파트매매가격의 급감과 동시에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청년과 저소득층의 가계대출은 대폭 줄어든 반면, 중장년·고소득층(상위 30%) 위주로 가계대출이 더욱 증가했다 <도표 5, 6>. 지난해 다시 급증했던 가계부채 때문에 올해부터 시행된 DSR 스트레스 규제에 대처하여 서민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차별받지 않도록 보다 포용적인 주택금융정책이 요구된다2).

또한 시행사와 건설사의 PF대출을 비롯한 총 여신 거래 규모가 2022년 2분기부터 500조원을 돌파하면서 <도표8>, 상장건설사들의 유동비율이 급감하고 부채(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PF부실화와 재무 건전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표9>.

정부의 PF보증 등 “대마불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PF부실화로 인한 부도 위기가 예상되는 만큼3) 이제는 봉위수기로 응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세보증 역시 임대차간 무분별한 깡통전세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므로 전세사기특별법 도입에 주의가 요구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험에 처한 돌을 “사석(死石)”으로서 버리는 용기와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부동산금융에서 추진해야 할 방향은 바로 봉수위기이다.
➌ 디지털금융 : 조삼모사(朝三暮四) → 견리사의(見利思義)
윤 정부의 디지털금융 정책은 조삼모사와 같다. 즉, “간사한 잔꾀로 남을 속이고 희롱”하거나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윤 정부는 빅블러[Big Bulr: 산업간 경계융화] 시대를 맞아 미래지향적 디지털·금융 “혁신”을 핑계로, 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확대(은산·금산분리 완화), ⑥ 가상자산법 도입과 국내코인발행(ICO) 등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⑦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자본시장제도를 정비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⑧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모바일 OTP를 사용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은산·금산분리 완화는 공정경쟁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적어도, △은행의 음식배달업, 유통업, 로보어드바이저(AI주식투자), 가상자산업, △보험사의 상조업, 모바일상품권발행업, △증권사의 주식신탁방문판매업, 리츠 등은 분명 “디지털 금융혁신”이 아니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 시 ICO 방식 역시 지하경제만 활성화 시킬 뿐,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그 어디에서도 이미 5년 전부터 활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 선진화를 핑계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나 다름없다. 금융투자회사와 고액자산가의 차익에 대한 응능부담의 원칙을 포기하는 부자감세에 불과하며, 자산의 변동성으로 인한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과 사후 부당이득 환수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만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장조성자 의무호가 스프레드 축소나 공매도 과세 및 전산화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불법공매도를 근절하는 데 실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OTP의 경우 특정 은행의 비용편익만을 위해 전자금융사기에 취약한 인증수단을 사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제22대 국회는 디지털금융에서 <도표10>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 하여금 금융회사와 조삼모사식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로서 견리사의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1) LTV=주택담보대출금÷주택가격 (2023년 개정안 <도표3> 참고)DSR=(주택담보대출 연간원리금 상환액+기타 대출원리금 상환액)÷연소득 (총대출 1억원 초과시, 현행 제1금융 40%, 제2금융 50%)DTI=(주택담보대출 연간원리금 상환액+기타 대출연간이자 상환액)÷연소득 (현행 투기·과열지역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60%)
2) DSR 스트레스금리 ={(A)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B)매년 5월, 11월 기준금리}×{(T)만기÷30년} (단, 하한 1.5%~상한 3.0% 적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3).
3) 현재 부도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보다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평균 부채율이 높았던 상장건설사는 10개사, 유동성이 나쁜 상장건설사는 16개사로, 현재 22%의 상장건설사가 부도위기를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 구본천. (1998). 企業退出의 經濟分析과 改善方案[기업퇴출의 경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시리즈 No. 98-07. URL: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244
• 금융위원회 (2023).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URL: https://www.fsc.go.kr/no010101/79514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3).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 URL: https://www.fsc.go.kr/no010101/81343
• 대한민국정부. (2022).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제20대 대통령직인수 위원회.
• 정호철. (2022).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가미는 거품경제.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13). URL: https://ccej.or.kr/posts/VntVjn
• 한국은행. (2023). 금융 안정 보고서(2023년 12월). 참고1: 22-25.URL: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93/view.do?nttId=10081414&menuNo=200068
• KB부동산 데이터 허브 (2024. 5. 16. 조회).
• 국가통계포털 (2024. 5. 14. 조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4. 5. 14. 조회).